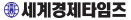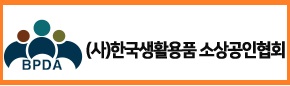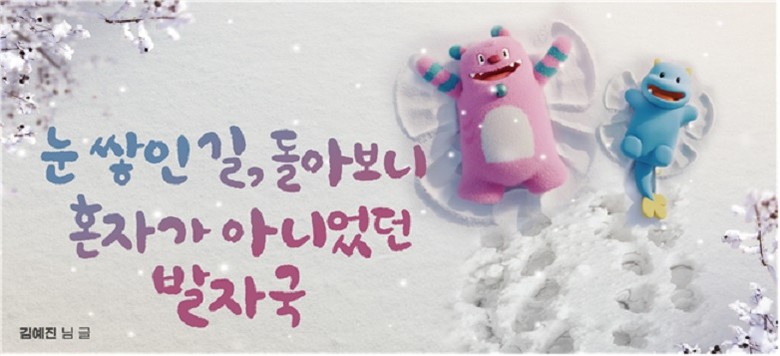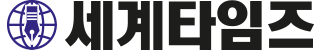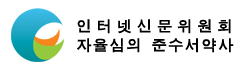|
| ▲ |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상의 샘물을 만들어 낸 불세출의 두 인물이 있다. 한 사람은 문에 퇴계 이황(1501∼1570)이요, 또한 사람은 무에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다. 퇴계 이황은 역사속에서 공직자, 교육자, 사상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한 그의 업적 뒤에는 경이라는 신체수양의 교훈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몸소 실천하여 깨닫게 하였던 신체활동이 바로 투호이다. 그는 투호 신체수양을 통한 실천적 학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다.
퇴계 이황은 투호 신체수양을 통해 덕을 완성시켰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지론을 설파하였다. 특히 퇴계 이황의 「언행록」에는 제자들에게 투호를 실시하게 하고 그 덕을 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진수(2001), 한국체육사상사, 한양대학교출판부).
‘선생은 여러 학생들에게 투호를 시키고, 그 덕을 보게 했다(先生使諸生投壺 以觀其德).’ 여기에서 등장하는 제생은 퇴계 이황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사람으로 퇴계 이황의 문하생들을 뜻한다. 이미 16세기의 퇴계 李황은 투호 신체수양으로 덕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완성시켜 나갔다(송일훈, 이황규, 이진수(2006), 퇴계 이황의 덕으로서의 신체운동, 한국체육학회지, 45(1), 45-55).
퇴계 이황은 투호를 정신을 집중하는데 사용했기에, 이를 정심투호라고 한다. 원래 투호는 온 몸의 균형을 잡고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야 그 적중률이 높다. 몸이 흐트러지면 결코 화살을 잘 넣을(적중할)수 없다. 또한 정신력을 집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정신력의 집중이 중요하겠지만, 투호는 잡념이 생겨 정신이 산란해지면 결코 명중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첫째는 건강을 위하여, 둘째는 정신집중을 위하여 그는 투호를 생활 속에 도입했다.
무의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23전 23승의 무패신화를 기록하였으며, 투철한 구국심을 바탕으로 국가를 지켜내었다. 이러한 숭고한 그의 업적 뒤에는 그의 신체사상이 담긴 사법의 궁술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공무를 마친 후에 정신통일을 위해 활터에 가서 활을 쏘았다. 특히 그는 전장의 풍우 속에서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활터로 향하였고, 궁술 신체수양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자아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을 다스려 전쟁에서도 平常心是道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충무공 이순신은 부하장수들과 병사들에게도 그가 얻은 平常心是道(평상심이 곧 도)를 심어주기 위해 궁술 신체수양을 실시했다. 그는 신체수양을 위해 부하들에게 직접 궁술을 지도하였는데,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를 살펴보면 그 기록이 보인다. 그는 궁술 신체수양에 있어서 마음을 통일시키지 못하면 과녁을 맞힐 수가 없기에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쏘아야 한다고 부하장수들과 병사들에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줄을 선 궁사들이 차례로 쏘아 과녁을 맞히면 지화자 노래를 부르면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이렇듯 상무정신의 교육은 궁술 신체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은 결코 하루 아침에 완성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자아를 완성시킨 장본인이다. 이처럼 그는 궁술을 통해 신체수양을 하여 지휘력, 통찰, 관찰력 자질을 발휘하였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국가를 지켜 낼 수 있었다. 두 인물에 신체의 교육은 투호와 궁술의 신체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문과 공부를 한 학생들은 무과공부가 전무하고, 무과 공부를 한 학생들은 문과 공부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체육특기생과 일반학생들을 일컬은 말이다. 즉 머리만 좋고 성격이 나쁘면 무슨 소용이며,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는 소용이 없다. 이러한 심신의 불균형은 우리교육에 큰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비윤리적인 패륜적 악행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즉 덕성이 없는 비인간성이 사회의 존폐 위기를 만들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청소년 사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살인사건 및 집단구타, 그리고 각종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대의 실천적 신체관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신체수양론>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문무양도>라 하는 문과 무의 도를 겸비한 조화로운 전인 인간상을 찾아주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문인의 경우 퇴계 이황의 투호와 무인의 경우 충무공 이순신의 궁술에 보이는 신체수양과 두 인물 삶의 일대기를 통해 <문무양도>를 겸비한 전인 인간상을 찾아주고자 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