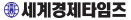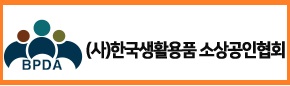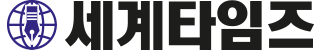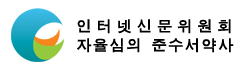|
| ▲ |
즉 한국 교육의 붕괴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체적인 교육 철학의 부재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그 이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래 우리의 교육은 서양, 특히 미국식 교육을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은숙(2001), 「이황의 『 언행록 』 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성 교육론」, 한국국민윤리학회).
한국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가치 상대주의로의 전환과 이진법적인 계산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는 인간적인 정이 메마르고 어느 것이 올바른 가치이고 어느 것이 그른 가치인가에 대한 검토는 아무도 하지 않는 계산적인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특징인 이성과 감성의 조화는 이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번거로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 아니면 아니오,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식의 단순한 사고능력을 지니며 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은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서은숙(2001), 「이황의 『 언행록 』 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성 교육론」, 한국국민윤리학회).
이러한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우리가 퇴계 이황의 사상에 관한 덕으로서의 신체사상과 그의 제자양성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退溪全書』, 修正天命圖說·聖學十圖·自省錄·朱書記疑·心經釋疑·宋季之明理學通錄·古鏡重磨方·朱子書節要·理學通錄·啓蒙傳疑·經書釋義·喪禮問答·戊辰封事·退溪書節要·四七續編》이 있고, 작품으로는 시조에 《陶山十二曲》, 글씨에 《退溪筆迹)》이 있다).
그는 전인교육을 통하여 유가의 최고의 경지인 성인을 양성하려 했다. 그 역시 머리만 좋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 역시 신체적 체험을 통해 그 경지에 도달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은 오늘날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공직자로서의 퇴계 이황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로서 깨끗한 청백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백운동서원을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으로 만들었다. 셋째, 벼슬에 사퇴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넷째, 경복궁의 기문과 상량문, 현판 글씨, 외교 문서 등을 작성하여 명성을 떨쳤다.
다음으로 교육자로서의 퇴계 이황의 일생이다. 첫째, 서원건립에 힘써서 많은 서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둘째, 과거시험 준비나 출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락하였던 학문 풍토를 개선했다. 셋째,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손수 교과서를 만들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했다. 넷째, 학문하는 태도의 모범을 보이고 바람직한 선비상을 확립했다. 다섯째, 제자를 사랑하는 올바른 스승 상을 정립했다.
다음으로 생활인로서 퇴계 이황이다. 첫째, 예안향약 곧 향약입조 28조를 정하여 향촌의 풍속을 교화했다. 둘째, 합리성을 존중하여 현실에 맞는 예법을 시행했다. 셋째, 한 평생 '경(敬)'의 태도를 실천하여 인격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넷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했다.
마지막으로 사상가로서의 퇴계 이황이다. 첫째, 고봉 기대승(1527~1572)과의 4단 7정에 관한 논쟁을 통하여 학문적 논쟁의 모범을 보여주고 성리학의 심성론을 크게 발전시켰다. 둘째, 수양론의 실천방법을 정밀하게 규명하여 조선시대 도학의 기본 틀과 독자성을 정립했다. 셋째,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동양사회에 전파했으며 특히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넷째, 문학자로서 2000편이 넘는 많은 시를 지었다.
이이(1536~1584)가 퇴계 이황에게 보내는 시이다. 시냇물은 수사에서 나뉘고 봉우리는 무이산처럼 빼어났네. 살림살이는 경전 천 권이요, 거처는 두어 칸 집뿐이로다. 회포를 푸니 맑은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듯 웃으며 나누는 얘기는 거친 물결을 나를 잠재우네. 소자는 도를 듣고자 함이니 반나절 한가로움 헛되이 보냈다 마옵소서(溪分洙泗派 峯秀武夷山 恬計經千卷 行藏屋數閒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簡 小子求聞道 非偸半日閑).
위 시는 이이가 처가(성주)에서 강릉 외가로 가는 길에 예안의 계상서당에 퇴계 이황을 찾아가 시 한수를 읊어 바쳤다. 이때 이이의 나이가 23세, 퇴계 이황의 나이가 58세이다. 이이 헌시에 대해 퇴계 이황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 화답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내 병들어 문 닫고 누워 봄이 온 줄 몰랐는데 그대 만나 얘기를 나누니 심신이 상쾌하구나.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지난 날 나는 몸가짐도 제대로 못해 부끄럽소. 깨끗한 곡식에는 강아지풀 용납할 수 없고 새로 닦는 거울에는 티끌도 침범할 수 없다오. 부질없는 이야기는 모두 제쳐 놓고, 힘써 공부하여 우리 서로 친해보세(病我로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 已知名下無虛士 堪愧年前闕敬身 嘉穀莫容梯熟美 纖塵猶害鏡磨新 過情時語須刪去 努力工夫各日親).
이상으로 퇴계 이황의 덕으로서의 신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는 학문과 신체운동의 투호를 통해 지, 덕, 예, 효 등 모든 부분에 출중하였던 팔방미인임을 알 수 있다. 퇴계 이황은 오늘날로 표현 한다면 지, 덕, 체를 모두 갖춘 인물이자, 리더십(Leadership)까지 소유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 덕, 체의 함양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퇴계 이황은 그가 행하고 추구하고자 하였던 덕으로서의 신체사상을 통해 진정한 <성인>을 완성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퇴계 이황의 가르침에 비추어 오늘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신체사상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신체지(身體知) 또는 무덕지(武德知)를 함양 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시대에 지, 덕, 체를 갖춘 조화로운 전인 인간상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